19세기 중엽, 미국에서는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소위 "영리의학교(proprietary medical school)"이라고 하여 의사 몇 명이 모여 강의 좀 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의사들은 환자 보는 것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이런 "교육사업"도 한 것이었다.
당연히 의사의 질이 높을 리 없었다. 허나 당시에는 일류 의사들도 진단은 가능하되, 치료법이 없다는 "의료 허무주의(medical nihilism)"에 빠져 있던 때여서 정규의사나 돌팔이나 뭐 큰 차이도 없었다. 하지만 불과 이삼십년 만에 이러한 양상은 확 바뀌게 된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의료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었고, 돌팔이에게 치료받다가 잘못 되면 그것도 역시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다. 어차피 의사에게 간다고 다 살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면허를 통해 특정 의사들에게만 진료권을 허용한다? 유럽 대부분은 전통적인 의사 길드가 그렇게 했지만, 자유방임을 내세운 미국 땅에서는 이게 바로 "독점"이었다. 게다가 서부의 광활한 땅에, 아무도 없기 보다 의사 하나라도 배치하려면 저런 시스템도 나쁘지 않았다. (요즘 우리 정부의 시각과 비슷하다).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의학은 드디어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청진, 타진, 사후부검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의대의 교수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 드디어 개복 수술이 가능해졌다. 테오도르 빌로트 같은 사람이 그 선구자였다.
그러니 6개월 학원 교육 받은 미국 의사들이 실력을 닦기 위해 프랑스로, 독일로 대거 유학들을 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 첫번째, 실력을 닦으면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그리고 두번째 6개월짜리 학원 의사가 아닌 정식으로 유럽의 대학에 적을 두고 배우면 "명성"이 생기니까. 물론 환자를 더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주 정부에 면허를 요구하고, 돌팔이들과 차별화하고, 마침내 미국에 제대로 된 의대를 세웠는데 그게 존스 홉킨스 의대다. 웰치, 오슬러, 홀스테드 같은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 그 뒤 의학사에 거대한 업적을 남긴 존스 홉킨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한국은 실력을 닦아 더 중환을 볼수록, 더 돈이 안 되고, 명성이 높아지긴 커녕 감옥 갈 위험만 높아진다. 명성은 의사 개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주로 그가 어느 기관에 속해있느냐에 달렸다. 부산의대 교수는 뭐 혈관 수술 실력이 부족한가?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명의" 만드는 언론사 기자들의 수준이 그러하다. 그들이 또 일반인들의 환상을 조장하고.
이 땅에서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의대 6년제 말고, 6개월제 하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면허처럼 면허를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바이탈과 안 할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럴 바엔 6개월만 교육한들 무슨 상관이랴.
이런 수가와 이런 법제도 하에서는 무슨 인도나 동남아 의사라도 이 땅에 오려 할까? 걔들도 오면 레이저나 쏘겠지.
p.s.50대 넘으면 마음에 여유를 갖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편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포스팅을 읽었다. 옳은 말이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글이나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울화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쓴다.
ㅡ의대 교수님 글 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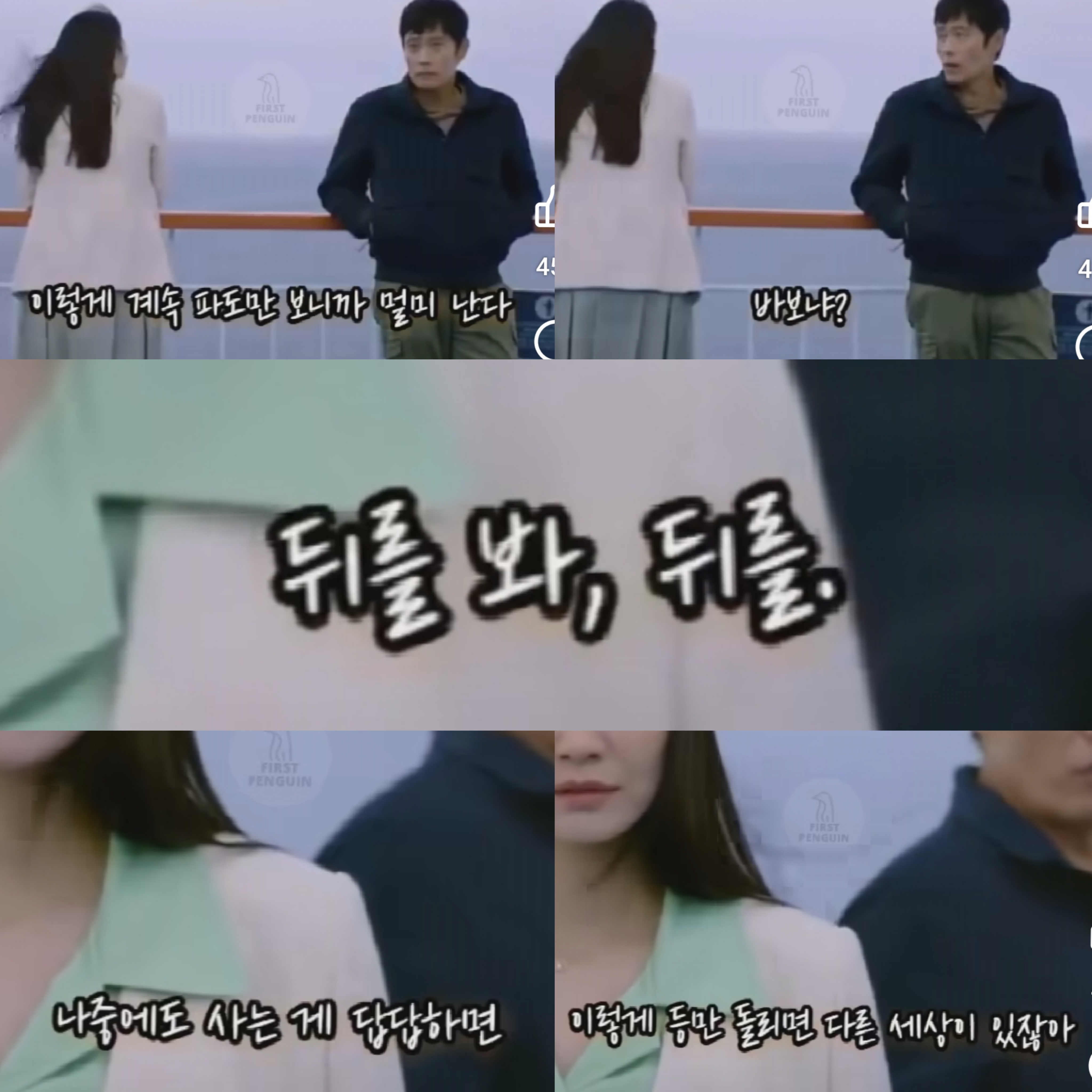
'보관용 기록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신의 비용 (2) | 2024.01.28 |
|---|---|
| 석촌동 1960년대 (0) | 2024.01.28 |
| 19세기 후반 일본과 조선의 차이 (0) | 2024.01.25 |
| VIP 신드롬 (0) | 2024.01.10 |
| 내실있는 삶 (0) | 2024.01.09 |



